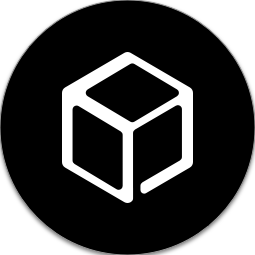奶奶爱吃泡菜
阅读之前享受音乐
正文
厨房的角落,总有一两个笨重厚实的土陶坛。它们默默矗立着,仿佛和年逾六十的奶奶一样悄然嵌入了这个家,成为了一种恒定不移而安然的依靠。坛口每每飘出微凉的酸爽,如同某种固执的小精灵般钻入鼻孔,却从不会被谁忽略——那正是奶奶常年做泡菜的地盘上,流淌出来的生活底色之一章。
每次制泡菜的序曲,奶奶便要提前备下饱满而洁净的白菜,犹如她为孩子们预备的心意那般郑重。只见奶奶弯着微驼却依旧硬朗的腰,小心地从木架上取下泡菜坛子。先用滚烫的开水淋遍周身;待晾干后依次铺进切得均匀整齐的白菜块,再严丝合缝撒上盐,铺上红彤彤的辣椒粉;最后不忘郑重地投入蒜瓣和嫩生生的生姜片,末了还要浇上两勺清醇的米酒。这些仪式般一丝不苟的举动,在奶奶几十年的时光里反复,竟沉淀为一种神圣的守诺。待一切物料归于那寂静坛中,奶奶才轻轻把盖子盖严,用密封之水仔细封住最后一丝缝隙——坛身便如此安然沉寂在黑暗的角落,只等发酵默默带来生命的鲜浓气息。
日复一日的耐心守候过后,奶奶终于微笑着缓缓揭开坛盖,此时坛中透出难以言喻的复杂滋味:酸、咸、辛、辣、香奇异地交织着扑鼻而至,那些颜色经了时日酝酿,早已渗透入骨肉之间。奶奶取出一小碟泡菜放在餐桌之上,灯光朦胧映照下,那腌菜色泽油亮而红润生动,如一幅浓缩了时间的彩画。这时节,她脸上每一道皱纹便微微舒展开来,好似所有疲惫也在口中生津的那一刻,心甘情愿地融于无声——那是她亲手酿造的生命之味,自时光深处递来的回甘。
逢年过节,餐桌之上永远不可或缺这一碟红红白白的泡菜。夹起一块送入嘴里,牙齿刚刚碰到那柔韧爽脆的泡菜皮,汁液便如积蓄的思念被戳破,酸辣汹涌瞬间溢满喉头舌尖。孩子们吃得鼻尖上渗出微汗,忍不住大口呼气时,奶奶便会悄然展开笑脸,那舒展的温和表情恍如春末盛开的花儿。泡菜如同一条结实的绳索,将满桌欢言笑语紧紧编系其中——那一口浓烈的泡菜滋味,便成为家人心头不可错判的“家”的印章。
然而岁月终究比泡菜的颜色淡得快些,奶奶在坛旁转着的身形竟是一日比一日慢了下去。等到某一年,坛盖不再被揭开,那酸冽浓郁的家常味道也悄然从我们的餐桌上退场。如今每逢家人围桌而坐,偶想起昔日酸辣满口、热辣汗出的情景,心头便仿佛倒进一坛尚未熟透、酸味刺喉的生辣水,滋味未至而酸意已然直冲眼底。
那一个又一个盛过无尽滋味的坛子,曾替奶奶无言吐纳着日子深处的声响与气味。生活纵然如泡菜,多的是那微呛刺目的盐霜与涩辣;可奶奶却每每在揭开密封之盖时,将岁月咸苦中仅存的美意捞取出来,悉数捧进我们的碗里。——盐再烈,时间再刺人,原来也终掩抑不过她手上捧出滋味的那份心意。
当发酵成为心头的秘密魔法,坛盖上氤氲的水珠,封存的是奶奶从未言说之爱——每一枚盐粒皆生自她掌心的海,每一滴酸露都通往子孙血脉深处的记忆源泉。
韩文 Version
부엌 구석엔 언제나 한두 개의 투박한 옹기 항아리가 자리 잡고 있다. 예순이 넘으신 할머니처럼 집 안에 조용히 스며들어 변함없는 의지가 되어준 그 항아리들. 뚜껑 사이로 스민 시큼한 향기가 고집 센 작은 정령처럼 코를 스칠 때면, 우리는 곧장 알아챘다. 할머니가 평생 김장을 담그던 그 자리에서 흘러나온, 삶의 바탕을 이루는 이야기 중 한 장이 시작됐음을.
김장의 전주곡이 시작되면, 할머니는 아이들을 위해 마음을 다해 준비하듯 통통하고 싱싱한 배추를 정성스레 골랐다. 굽은 허리를 힘겹게 구부려 나무 선반에서 김치 항아리를 내려온 그녀. 먼저 뜨거운 물로 항아리 안팎을 깨끗이 씻어내고, 물기를 말린 후 균일하게 썬 배추를 차곡차곡 담았다. 소금을 고르게 뿌리고 빨갛게 타는 고춧가루를 올린 뒤, 마늘과 연한 생강 조각을 빠짐없이 넣고 맑은 막걸리 두 숟가락을 부었다. 수십 년을 반복해온 이 의식 같은 행동은 이제 신성한 약속이 되어 그녀의 삶에 배어 있었다. 모든 재료가 항아리 속으로 사라지면 뚜껑을 꼭 닫고, 물을 부어 틈새를 막았다. 어둠 속에 잠긴 항아리는 이제 발효의 시간을 기다리며 고요히 숨을 고를 뿐이었다.
날이 가고 달이 가는 기다림 끝에,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항아리 뚜껑을 열었다. 그 순간 코를 찌른 신맛과 짠맛, 매운 향이 뒤섞인 복잡한 향기. 시간이 재료의 살코기 속까지 스며들어 색깔은 더욱 짙어져 있었다. 할머니는 작은 접시에 김치를 담아 식탁 위에 올렸다. 흐릿한 조명 아래 절인 배추는 기름기로 반짝이며 마치 시간이 응축된 채색화 같았다. 그때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미세한 희망이 스쳤다. 피로마저도 입안에 번지는 새콤함에 녹아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녀 손으로 빚어낸 삶의 맛, 시간 깊은 곳에서 건져 올린 여운이었다.
명절이면 식탁엔 반드시 이 빨갛고 하얀 김치 한 접시가 올랐다. 김치를 집어 입에 넣는 순간, 쫄깃한 겉면을 치아가 맞닿자마자 갈무리된 그리움이 터져 나왔다. 시고 매운 국물이 목구멍과 혀끝을 뒤덮었다. 아이들이 매운 맛에 콧등에 땀을 맺히며 헐떡이면, 할머니는 봄꽃처럼 살며시 미소를 피웠다. 김치는 단단한 밧줄처럼 식탁의 웃음소리를 하나로 묶었다. 그 강렬한 한입이 가족의 마음에 새겨진 ‘집(家)’의 도장이 되었다.
하지만 세월은 김치의 색보다 빨리 바래갔다. 항아리 곁을 맴돌던 할머니의 발걸음은 하루하루 무거워졌다. 어느 해가 되자 항아리 뚜껑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고, 식탁에선 익숙한 시큼한 향기가 사라졌다. 이제 가족이 둘러앉을 때면, 예전의 매콤함과 땀방울이 떨어지던 기억이 떠오른다. 마치 덜 익어 목을 긁는 신 김치 국물을 마신 듯, 맛도 제대로 느끼기 전에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무수한 맛을 품었던 항아리들은 할머니의 말없는 삶의 숨결을 대신해 왔다. 삶이 김치처럼 짜고 자극적인 소금기와 매움으로 가득할지라도, 할머니는 뚜껑을 열어내는 순간 그 속에 남은 온기를 건져 우리 그릇에 가득 담아주셨다. — 소금이 얼마나 짜고 시간이 얼마나 무겁더라도, 그녀가 손수 만든 맛을 건네주던 마음만큼 강렬할 수는 없었다.
발효가 마음속 비밀 마법이 되었을 때, 항아리 뚜껑에 맺힌 물방울은 할머니가 한마디도 하지 않은 사랑을 갈무리한 상징이었다. 소금 알갱이 하나하나가 그녀 손바닥에서 태어난 바다였고, 신맛 한 방울이 자손의 피 속 기억 샘으로 흘러가는 길이었다.